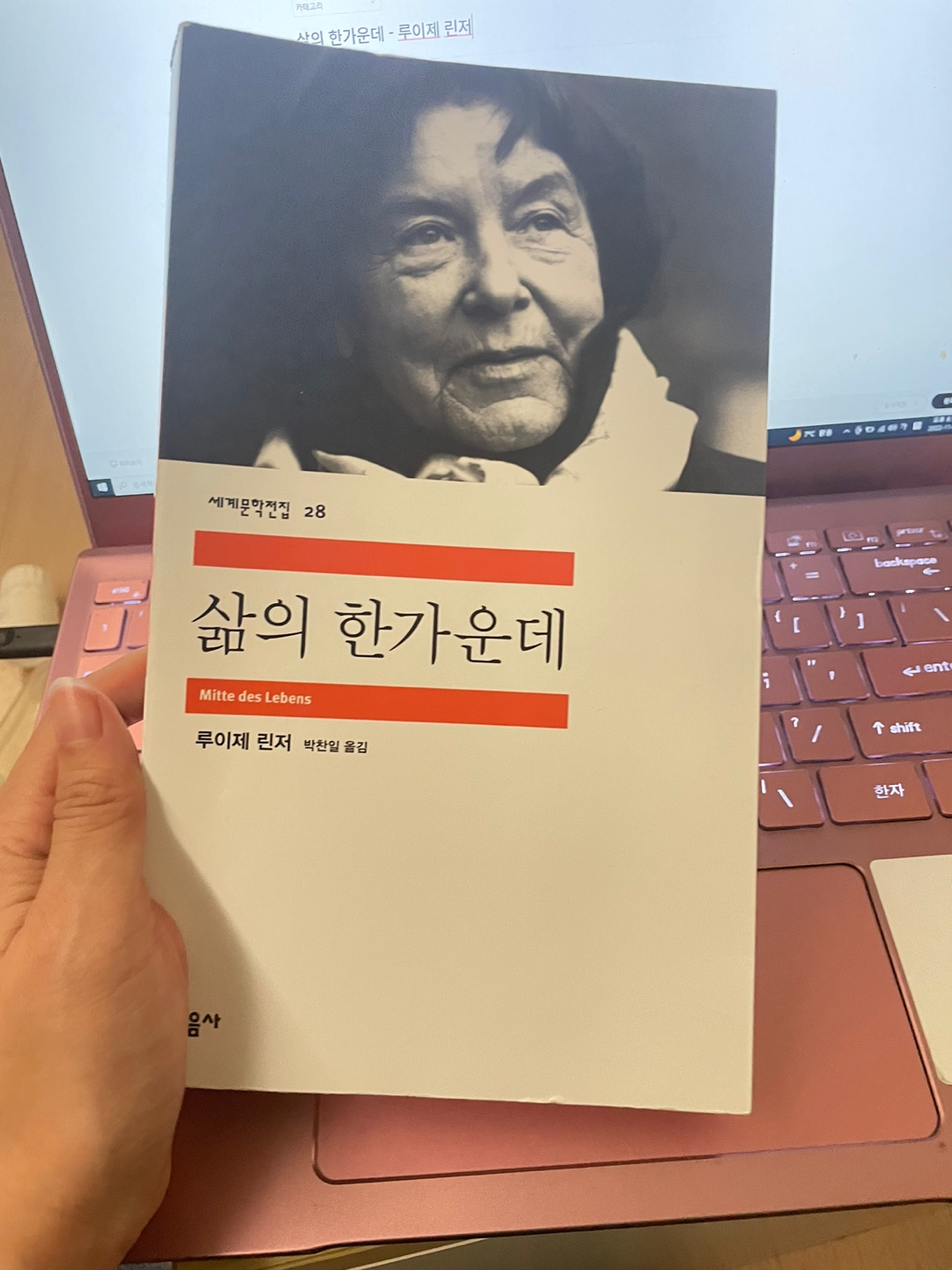
줄거리
암으로 죽은 슈타인 박사가 니나 앞으로 꾸러미를 보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 그녀를 향한 욕망, 사랑, 질투 등 그가 순간순간 느낀 감정들이 기록한 일기장이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연가는 아니었는데,
첫 만남부터 그녀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을 관찰하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들을 담아낸 기록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내 생각
처음에 니나를 보며 삶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젊은 여자로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고되었지만 소신이 있었고, 생동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순애보 같이 바라보는 슈타인을 공감했고 동정까지 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캐릭터들에 대한 나의 인상은 바뀌었는데,
400page까지 "알겠어, 알겠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작가가 그녀는 매력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책의 처음과 끝자락에서 바뀌어버린 내 환경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슈트만이 말한 것처럼
니나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가 독자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게끔 프레임을 씌워놓았을 뿐
실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사랑에 무정하고, 자기 식대로만 삶을 이해하고 행동해버리는 위협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슈트만의 사랑도 더 이상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니나에게 허상을 두고,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범벅 했고 사랑이 아닌 자신을 향한 애정처럼 보였다.
슈트만이 니나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녀를 지속적으로 사랑했을까?
그는 연민에 빠져 있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 것 같았다.
그게 원래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했다.
내가 니나라면 인간미를 선택적으로 보여주진 않을 것이고, 선택으로 선의를 베풀지 않겠다.
슈트만처럼 산다면, 갖고 싶다면 얻기 위해 할 만큼 해보겠다. 껍데기만이라도 가져보겠다.
확 불을 태우고 재처럼 타버리겠다.
잔여물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만큼 해보고 그 이상은 나의 소관이 아님을,
그저 이럴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이겠다.
나의 생각과 달리 이 책이 팔렸을 당시
독일엔 니나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캐릭터가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독일인의 시대적 그림자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모두가 회색이라면 붉고 노란 정열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테니 이해는 간다.
지금은 모두가 정열적으로 비쳐서 그런가
나는 차라리 회색처럼 남아있는 그녀의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떠한 정열도 없고, 시대에 순응하며 안전한 삶을 살기를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것에도 열정을 태우지 않는..
그렇기에 괴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나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니나 신드롬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전혀 공감은 할 수 없음을 느낀다.
'* 집사의 사생활 > -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0) | 2023.02.18 |
|---|---|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드 보통 (2) | 2022.11.13 |
| 다섯째 아이 - 도리스 레싱 #민음사 (0) | 2022.10.30 |
| 죽여마땅한사람들 - 피터스완슨 #사이코패스소설 (0) | 2022.09.10 |
| 나를 살리는 철학 - 알베르트 키츨러 #클레이하우스 (0) | 2022.07.23 |



